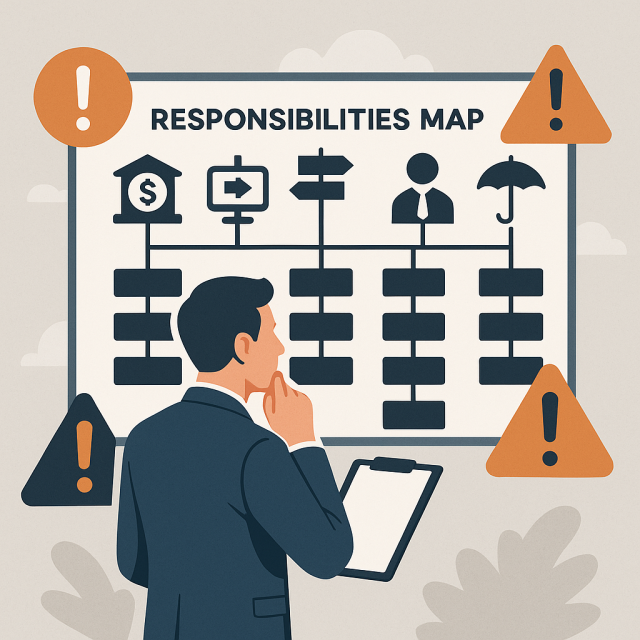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저축은행업계에도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조직 규모가 큰 은행처럼 준법·리스크·소비자보호 등 기능별로 임원 책임을 세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은 여신·IT·민원 등 위험 영역별 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책무구조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2026년 7월부터, 그 미만은 202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의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표이사에게 ‘총괄관리의무’가 포괄적으로 부여돼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임원별로 담당 영역이 구체적으로 구분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내부통제 실패 시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경영진의 통제 의무가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조직 구조상 은행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부분 본점–지점의 단층 구조로 운영돼 중간조직이 없다. 반면 은행은 본점–본부–지점–팀으로 이어지는 다층 조직을 갖고 있어 준법감시·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 등 기능별 책임 구분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고 IT 외주 비율도 큰 만큼, ‘기능별’이 아닌 ‘위험영역별’ 통제모델이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열린 상호저축은행법학회 발표에서 김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축은행은 복잡한 기능조직을 꾸리기보다 대표이사–내부통제총괄–지점책임자로 이어지는 3단 통제 구조가 현실적”이라며 “기능별이 아닌 업무 단위 중심으로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를 실제로 이행했음을 입증할 ‘관리이행 증빙’을 남겨야 한다”며 “내부 회의록, 시정조치 결재 내역, 외부 자문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금감원은 이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