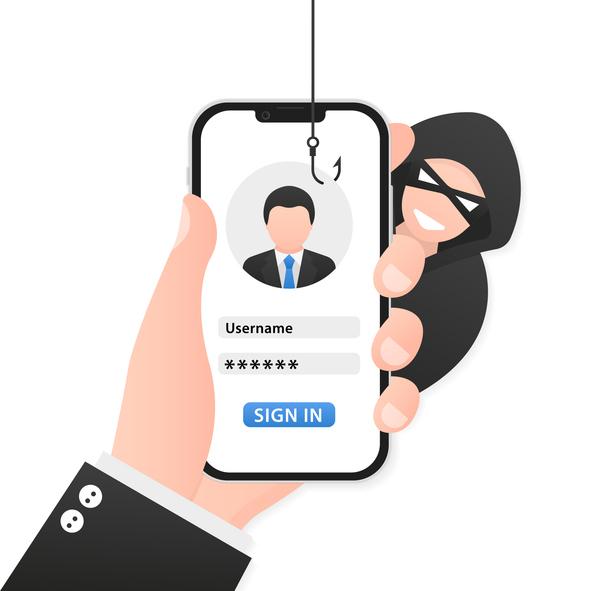
지난해 4월 직장인 A씨는 페이스북 휴대전화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제안을 받았다.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번호, 통신상정보 등을 피싱범에게 넘겼고 이 정보는 범행에 악용됐다. 같은 해 8월 한 피싱범은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탄소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피해자를 허위 탄소 거래 투자 사이트로 유인했다. 피해자는 이 범인에게 결국 1500만원을 잃었다.
최근 피싱 범죄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한 유인 방식이 주된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건수는 지난 2019년 2756건에서 지난 2020년 1만2402건으로 4.5배 급증했다. 지난 2021년에는 1만6505건, 2022년에는 1만5856건, 2023년에는 1만3179건에 달했다.
SNS 기반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규제는 주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통신 3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사업자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통신 3사는 허가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자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과기정통부에 신고만 하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왔다.
손금주 율촌 변호사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상시적 규제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사전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NS 기반 피싱 대응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찰청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가동한 ‘다중피해 사기 대응 TF’에 참여해 SNS 기반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SNS 게시물, 카카오톡을 사용한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기 목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예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없어 심의·차단이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기 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선 플랫폼과 정부 각각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플랫폼 자체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보안 책임 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해볼 수 있다"며 "플랫폼에서도 피싱 탐지, 메일·메신저 필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기술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