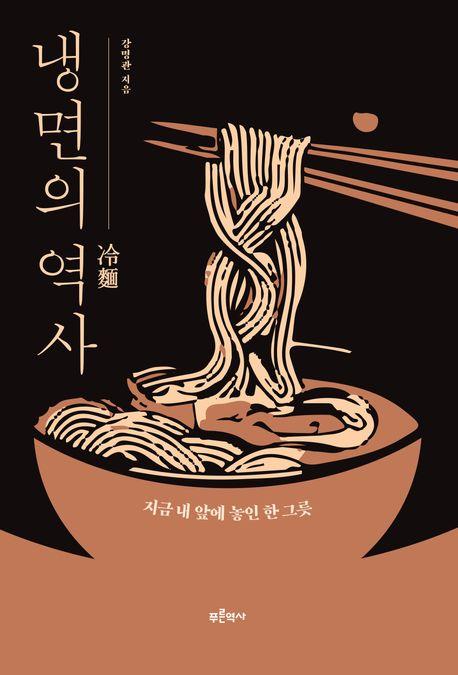
냉면의 역사=강명관 지음, 푸른역사
“냉면을 먹었더니 발바닥이 차가워졌다.” 조선 인종 때인 1558년, 선비 이문건은 <묵재일기>를 통해 이렇게 썼다. 한국 음식문화사에서 처음으로 ‘냉면’이란 말이 등장한 것이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명예교수인 저자는 스스로를 학문학자 겸 냉면주의자라고 칭한다. 그는 신라 진흥왕이 순행 길에 얼음을 띄운 메밀국수를 먹었다는 ‘기원’에서 시작해, 진주냉면의 부활과 물냉면의 탄생에 이르는 ‘분화’까지 냉면의 발자취를 밝혔다. 고조리서를 뒤져내 선조들의 국수 조리법을 소개하고, 냉면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도 보여준다. 고려 문인 이색의 <하일즉사>, 장유의 시 <자주빛 장물에 말아낸 냉면>, 이광수의 여행기 <남유잡감>, 이효석의 에세이 <유경식보> 등이다.
냉면에 담긴 경제학도 알 수 있다. 국수틀 도입으로 균질한 국수를 별다른 노동력 투입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냉면은 상업화됐다. 18세기 후반 황윤석은 대궐에서 하인을 시켜 국수를 사 오게 해 먹은 기록이 있으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메밀국수를 파는 국수가게가 등장한다. 19세기 냉면은 직장인의 음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는다. 1940년엔 업자들이 냉면 가격 동결을 피하기 위해 양을 줄이자 조선총독부가 냉면 가격과 국수 양을 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신라 진흥왕이 어느 여름날 북부 국경 지대로 순찰을 나갔다. 무더위에 가지고 갔던 궁중 음식이 모두 상해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신하들이 산속에 사는 화전민의 음식인 메밀국수에 얼음 두어 개를 띄워 진흥왕에게 올렸다. 이것이 냉면의 시초라는 이야기다.” (22쪽)
“아지노모도는 매우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그 편리성은 비싼 값어치를 하고도 남았다. 특히 한여름에 굳이 동치미를 담글 필요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간편했겠는가.” (2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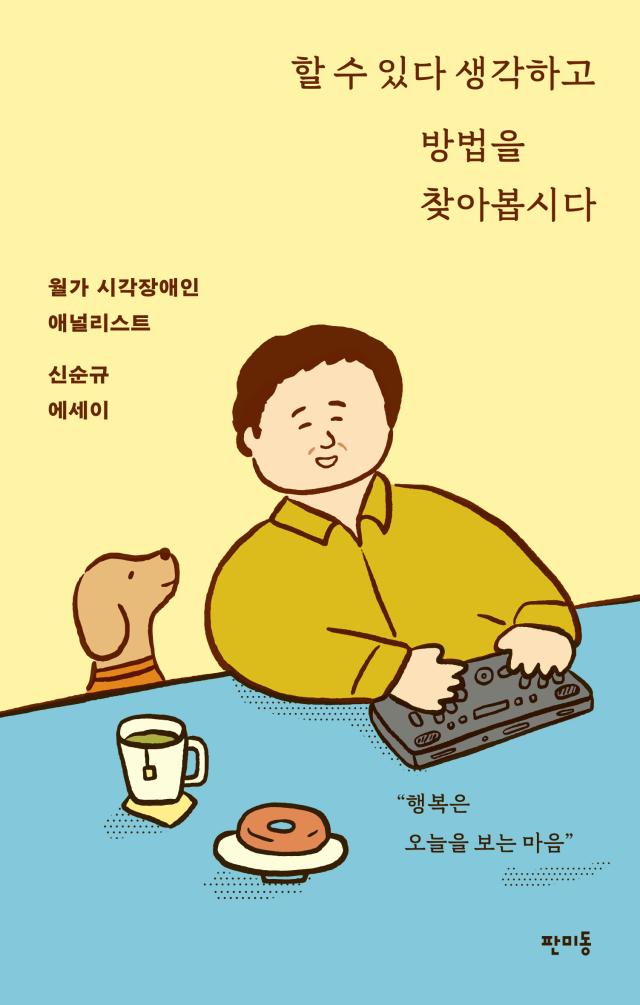
미국 월가에서 31년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시각장애인 신순규의 신작 에세이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는 저자가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 남긴 말이다. 이 말은 저자가 미국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시각장애인인 자신에게 양궁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 한 말이다. 이후 이 말은 그의 삶을 이끄는 신념이 됐다. 저자는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마다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실패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월가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바라본 투자와 경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를 진솔하게 전한다. 아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과정 등 가족 이야기를 비롯해 사회적 포용, 투자 과열 시대에 지켜야 할 원칙, 감사하는 마음과 유머로 하루를 완성하는 지혜 등이 담겨 있다.
저자가 2025년 9월 파리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축제’에서 무대에 올라 한 연설 전문도 책에 실렸다. 그는 “우리의 더 큰 목표는 인류가 힘을 합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며, 심지어는 흔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는 나에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애 때문에 급속도로 변질되어 가는 세상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틀림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은, 시력을 되찾는 기적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주는 일은,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 혹은 직장 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12쪽)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