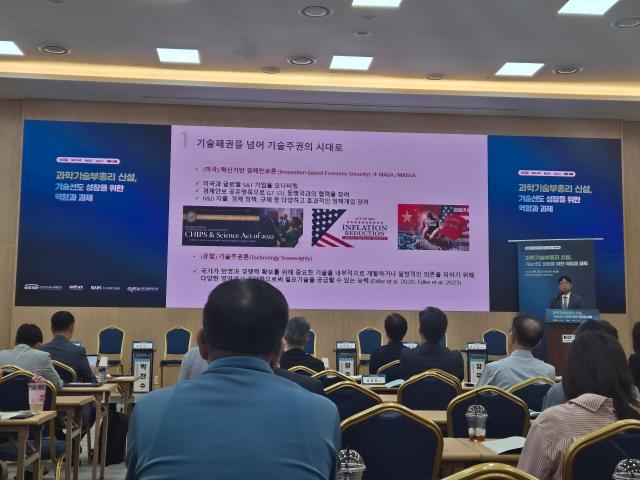
과학기술부총리제(부총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산업은 물론 통상, 안보까지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개발(R&D)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의 5%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한국공학한림원(NAEK),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술이 경제 효율성과 혁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중국 기업 화웨이의 예를 들며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의 R&D 센터를 가지고 1년에 31조5000억원 정도 쓰고 있다"며 "일개 기업이 한국 정부보다 많은 돈을 R&D에 투자하는 모습은 기술 패권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연구개발(R&D)는 산업 경쟁 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 구축의 필수 요소이자 국가 간 기술협상에서 전략적 옵션을 확장시키는 협상 수단의 역할을 한다"며 "개별 부처보다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총리는 R&D를 중심으로 산업, 통상, 규제, 인재 정책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 부처는 인재 정책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부총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 R&D 예산의 5%를 고정시키는 별도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개별 부처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총리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총리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술 규제를 정리하고, 개별 부처가 놓치기 쉬운 거시적 관점에서 패키지형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AI 혁명 속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생존과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기부총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마무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