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철 스님, 출처: media Buddha.net ]
[원철스님의 ‘가로세로’] 겨울초입인지라 코끝이 싸아하다. 중국 복건(福建푸젠)성에 있는 주희(朱熹1130~1200)의 무이계곡(武夷溪谷)을 영남 땅에 재현했다는 무흘계곡을 찾았다. 경북 김천 증산면 불영산에서 발원하여 성주 가천면 수륜면으로 이어지는 대가천에 아홉군데 명소를 지정하면서 무흘구곡이 되었다. 상류에 자리잡은 무흘정사(武屹精舍 김천시 증산면) 입구에서 계곡 건너 편을 보니 나무에 달린 붉은 감이 초겨울 빈산의 단풍을 대신하며 처연한 모습으로 서 있다. 천천히 발걸음을 계곡 쪽으로 옮기니 다리를 겸한 보(洑)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량이 많은 날에는 물에 잠겨 건널 수 없을 만큼 낮았다. 구곡의 7번째 명소인 만월담(滿月潭)이 가깝다. 계곡의 지류를 가로질러 만든 비설교(飛雪橋)도 있었던 모양이다. 이름 그대로 달밤(滿月)에 흐날리는 눈발(飛雪)을 감상한다면 참으로 멋지겠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했다. 조선중기의 대유학자 한강 정구(寒岡 鄭逑1543~1620)선생의 행장은 물론 당시 함께 했던 스님들의 흔적이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하고 마른 풀이 가득한 마당과 푸른 대나무를 병풍처럼 두른 집주변을 이리저리 살폈다. 본채와 부엌 그리고 작은 별채 등 3동이 쓰러질 듯한 자세로 아슬아슬하게 겨우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집을 짓고 유지 보수하는 일에 승려들의 기여도가 많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지라 주춧돌만 남은 폐사지를 마주한 것보다 더한 안쓰러움이 일어난다.

[원철스님 제공]
민가와 동떨어진 외진 곳이라 처음부터 공사가 쉽지 않았다. 집을 짓기 전인지라 건축주가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7~8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제대로 규모를 갖춘 사찰인 청암사(靑岩寺)에서 왕래하며 공사를 독려했다. 오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매우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신열(信悅)을 비롯한 젊은 승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공사가 끝났다. 62세 때 일이다. 7~8년을 머무르며 많은 저술을 남겼다. 물론 그 저술이 나오기까지 많은 승려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무흘서재에는 문도들이 재사(齋舍)를 짓고는 승려를 모집하여 지키게 했다. 무흘정사 안에는 수많은 서책을 간직해두고 승려 공양주(부엌 책임자) 두 세명과 함께 거처하였다. 초가삼간 서운암에 서적을 보관해두고 인근의 승려를 불러와서 정사와 함께 관리하게 하였다. 1607년 홍수 때 물살에 휩쓸려 무너지고 정사도 허물어질 판국인데 인잠(印岑)과 승려 5~6명이 와서 인부와 함께 정사 서쪽에 예전보다 약간 더 큰집을 지었다.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까지 맡겼다. 무흘정사 기문(記文 정종호 지음)에 의하면 구한말까지 유지되었으나 관(官)에서 훼철했다고 한다. 대원군 시절 ‘서원철폐’ 정책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22년 정씨문중에서 4칸집과 포사(庖舍부엌)를 지은 것이다. 정우락교수(경북대)의 논문 ‘한강정구의 무흘정사 건립과 저술활동’ 에서 이런 과정을 상세히 밝혔기에 대충 간추렸다. 어쨋거나 집을 만들 때부터 오늘날까지 인근 사찰과 승려들이 음으로 양으로 간여했고 유지보수에도 적지않는 역할이 뒤따랐다. 유형이건 무형이건 8할은 승려들의 공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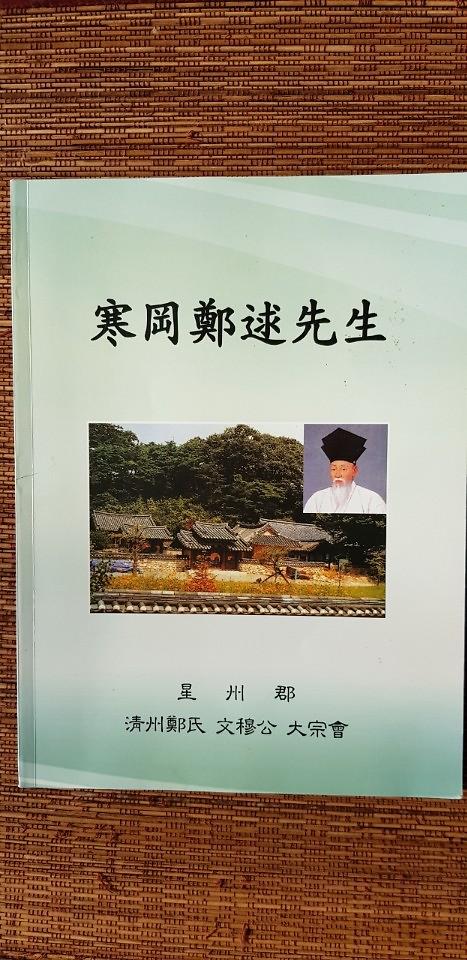
[원철스님 제공]
한강 선생은 대가천 물가에서 바라보는 가야산을 좋아했고 또 해인사를 자주 왕래했다. 37세(1579년) 때 기행문인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을 지었다. 숙야재(夙夜齋 성주군 수륜면)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며 “전경은 볼 수가 없고(未出全身面) 기이한 봉우리만 살짝 드러내네(微呈一角奇) 바야흐로 조화의 뜻을 알겠구나(方知造化意) 하늘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을(不欲露天機)“라는 시까지 남겼다. 임진란 때는 많은 책과 원고를 성주지방 유생들의 노력으로 해인사로 옮긴 덕분에 무사히 보존 할 수 있었다.(하지만 아깝게도 72세 때 노곡정사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김성탁(金聖鐸1684~1747)은 무흘정사 정씨장서(鄭氏藏書)에 대하여 ‘해인사의 불서와 대비할 정도로 그 양이 만만찮다’고 평가했다.
명당에는 반드시 전설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무흘정사 자리는 무흘계곡의 모든 정기가 모인 곳이라는 곡주(曲主 계곡주인)의 예언이 전해온다. 검은 도포에 흰수염이 표표히 나부끼는 도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선생이 젊은 시절 병환 중일 때 자화(自化 곡주의 심부름을 하는 이)가 가져온 환약(丸藥)을 먹고서 기운을 회복했다. 구곡(아홉골짜기)의 정기를 모았다는 영약이었다. “단명할 상(相)이지만 나의 계곡마다 훌륭한 이름을 붙여준 인연과 구곡마다 시를 한 수 씩 지어준 공덕으로 인하여 장수할 것이다”라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당시로서 적지않는 나이인 78세까지 살았다.
만월담은 달밤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흘정사에서 가까운 거리였다. 찾아 온 제자들에게 “이것이(밝은 달빛) 곧 천년을 전해온 군자의 마음이다. 선비는 이를 마음 속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此千載心也 儒者不可不心會也)”고 했다. 무대를 선원으로 바꾼다면 선종(禪宗)‘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래저래 무흘정사는 유불도(儒彿道) 세 집안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인 셈이다.
밖으로 이름이 나게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번거러워도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된다. 해인사 성철(1912~1993)스님은 수없이 찾아오는 이들에게 삼천배를 시킨 다음 만나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구선생은 접근이 쉬운 대로변에 있는 회연서원(성주 수륜면)을 떠나 심심산골인 오지(김천 증산면)로 몸을 옮기는 수완을 발휘했다. 그리하여 무흘정사를 지었고 누구든지 찾아오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주변에 신신당부했던 것이다.
산봉우리 지는 달은 시냇물에 일렁이고(頭殘月點寒溪)
나 홀로 앉으니 밤기운이 서늘하구나(獨坐無人夜氣凄)
벗들은 사양하노니 찾아올 생각은 하지마오(爲謝親朋休理)
짙은 구름 쌓인 눈에 오솔길 마저 묻혔나니(亂雪層雲逕全迷)

[원철스님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