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힘은 사랑과 같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차관보를 역임했던 조지프 나이의 오래된 논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힘은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겪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말이다.
최근 미국의 무차별 관세 부과와 남중국해에서의 거침없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직면한 중국은 요즘 이를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곧 따라잡을 것 같았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꾸준한 국방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반격 수단이 마땅치 않다. '신시대'를 선언하고 '중국몽(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의 실현을 앞당기려던 중국이 너무도 빨리 미국의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였던 시절 출판한 책들을 보면 '사랑'과 '우정'은 별로 특별한 단어가 아니다. 나르시시즘이 가득하고 세속적이기 그지없는 이 책들에는 두 단어가 넘쳐난다. 다른 단어를 써도 될 곳에도 '사랑(love)'이라는 단어가 남발됐다.
트럼프는 '거래(deal)'를 사랑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다. 부동산, 고객, 골프 그리고 골프잡지를 보는 것도 사랑했다. 트럼프 타워를 포함한 거대한 빌딩들과 여자들도 당연히 사랑했다.
친구와의 우정도 다르지 않았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에 합의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모두 친구라고 불렀으며,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을 만나도 깊은 우정의 대상이 되었다.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면 우정은 바로 사라졌다. '트럼프 타워'조차 친구로 부르며 "트럼프 타워가 좋은 친구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 거기 있었다"고 쓰기도 했다.
이처럼 트럼프에게 사랑과 우정은 흔한 데다가 반나절만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트럼프의 사랑과 우정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 대상은 트럼프 타워가 유일한 듯하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이 뱉은 말을 바꾸거나 교묘하게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책에는 미스 유니버스 미인대회의 주최권을 따낸 무용담이 자랑스럽게 서술되어 있다. 경쟁자였던 베네수엘라의 한 사업가가 얼마를 지불할 거냐고 묻자 트럼프는 400만 달러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그러고는 1000만 달러를 주고 주최권을 따냈다. 상대는 아마도 400만 달러보다 조금 더 제시했을 것이고 결국 트럼프에게 패배했다. 다음 날 아침에 베네수엘라 사업가가 따지자 트럼프는 4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싶다(I would love to)'고 했지 지불할 의도가 있다거나 지불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응수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까지 수차례 목도했듯이 사랑, 우정 따위의 단어는 여전히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석의 권한 또한 오롯이 자신의 것이다.
당장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지 제재를 푼다고 하거나 이별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강화된 제재조치나 폭격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변덕스런 북·미의 사랑과 미·중의 우정에 끼인 우리로서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랑과 우정이 증오와 불신으로 바뀐다면 '힘은 사랑과 같다'는 비유 그대로 현실이 되어 힘과 무력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도,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트럼프 타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안한 사랑과 우정이 있을까? 그러나 형식적인 윤리와 도덕, 딱딱한 관례와 전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셈법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북·미 관계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와 남북 관계를 최소한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비결도 국제정치의 정통적인 전략과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고 이를 북돋는 데 탁월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사랑이 답이다(Love is the answer).’
존 레넌이 짓고 부른 옛 노래, '심리전(mind games)' 가사 중 일부다. 트럼프라는 인물과 작금의 상황에는 영 어울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알 듯 말 듯한 사랑과 우정이 노랫말처럼 정말 해답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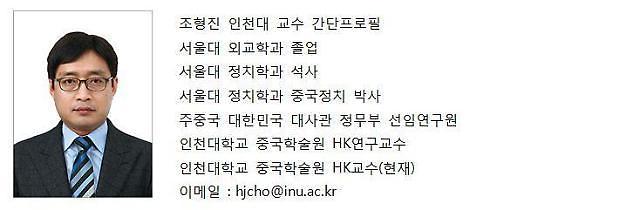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