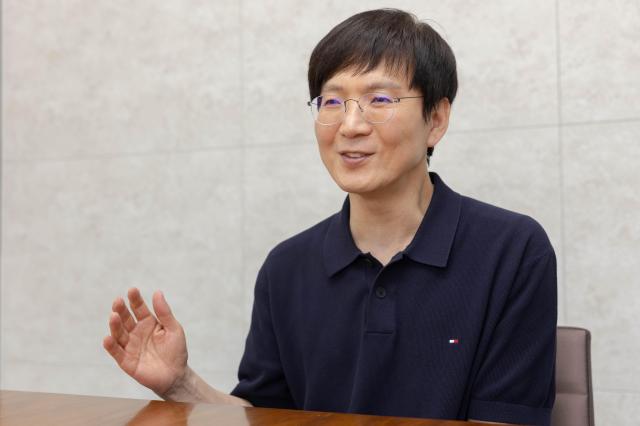
올해 상반기 과열 조짐마저 보였던 수도권 주택 시장이 최근 빠르게 식고 있다.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폭이 꺾이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내 집 마련 준비에 나섰던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진 상황이다.
국내 1세대 은행 PB(프라이빗뱅킹) 출신 부동산 전문가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 내내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단언했다. 규제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공급 추이와 금리, 통화량 등 ‘핵심 상수’를 고려할 때 부동산으로 향하는 돈의 흐름이 결코 쉽게 끊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고준석 교수의 견해다.
고 교수는 23일 “국내 1인 가구가 2021년 이미 900만가구에 이르는 등 갈수록 세대 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결혼 등을 통한 고정적 주거 수요도 꾸준해 공급이 입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위적 규제가 나오면 일단 시장도 2~3개월 간 ‘일시적 동면’에 들어가지만,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르면 추석이 시장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규제 영향에도 하반기 서울 중상급지 이상의 집값 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고 교수는 지적했다. 금리의 주택시장 통제 기능이 약해진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시장을 통제할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집값 흐름과 달리 거래량은 줄면서도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특이 현상’이 최근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강남권 등 핵심 상급지는 거래량이 감소하겠지만 가격은 조정받기 힘들 것”이라며 “매물이 많아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데 한강벨트 일대 역시 매매는 물론 전·월세 물량까지 크게 감소해 가격 조정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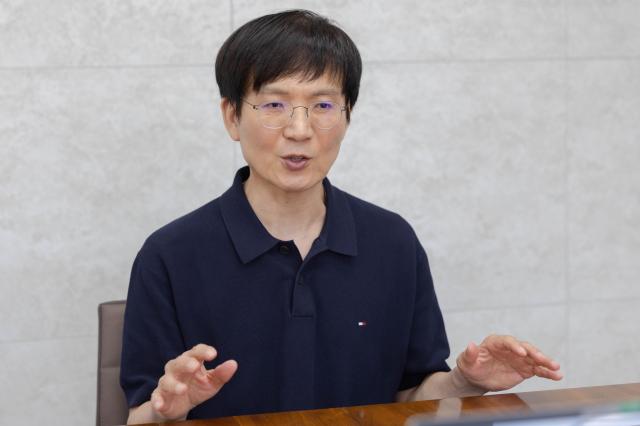
아울러 고 교수는 정부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정책과 금리인하 움직임도 하반기 규제 효과를 반감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이렇게 되면 서울 중하급지까지 시장 온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올 하반기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난 1년간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약 54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시장 통화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대출규제 국면에도 실수요자들이 청약은 물론 매매를 통한 투 트랙 전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방과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투자 및 실수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기존 상승기에는 지방의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경기 위축으로 지방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이 상승 싸이클을 타기는 어렵다”며 “비아파트 중 규제 여파가 덜한 오피스텔 역시 수요층이 적고 시세 차익 등의 자본 수익도 제한적이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에서 공공 중심의 공급 대책은 물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세제를 통한 규제도 내놓을 수 있다”며 “다만 공급과 금리, 통화량이라는 핵심 지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규제가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다. 입주 가뭄 속에서 전·월세 동반 상승압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자신의 자금 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준비해 향후 지역 갈아타기 등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