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언제나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시험대였다. 의지가 강할수록 시장의 반작용도 거셌고,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 되레 가격 불안과 자산 불균형을 키운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힌 메시지는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하다. 시장에 경고음을 울리고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다.
문제는 의지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며칠 전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를 공식화한 이후 시장의 반응은 정부가 기대한 ‘매물 출회’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는 시장이 정책을 ‘거부’했다기보다 현행 제도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아 움직였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양도세 중과는 거래를 유도하기보다 거래를 막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최고 80%를 넘나드는 세율 앞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선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강화될 때마다 시장은 ‘버티기’와 ‘증여’라는 두 갈래 출구를 찾아왔다. 매물이 늘지 않으니 가격은 경직되고, 자산은 가족 내부에서 이전되며 주택의 세대 간 고착은 더 심화됐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 실패라기보다 정책 설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줄인다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늘 그보다 한발 앞서 다른 선택지를 찾아왔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장 덜 불리한 길’로 자산을 옮기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메시지보다 정교한 조율이다. 거래를 막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를 유도하는 세제, 보유를 억누르는 규제보다 이동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한시적 감면과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보유 기간·주택 수·실거주 여부를 세밀하게 반영한 차등 과세 구조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증여와 양도 간 세 부담 격차를 지나치게 벌려 놓은 현재의 구조 역시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세금만으로 시장을 잡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공급 정책과 금융, 임대차 제도, 지역별 수급 여건이 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세제는 언제든 왜곡된 신호를 낼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전국 시장의 일반적 현상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의지로 잡히지 않는다. 구조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때 비로소 안정에 가까워진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분명 옳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하게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다르게 하겠다’는 설계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함정에 빠졌던 이유를 되짚는 일부터가 진짜 출발점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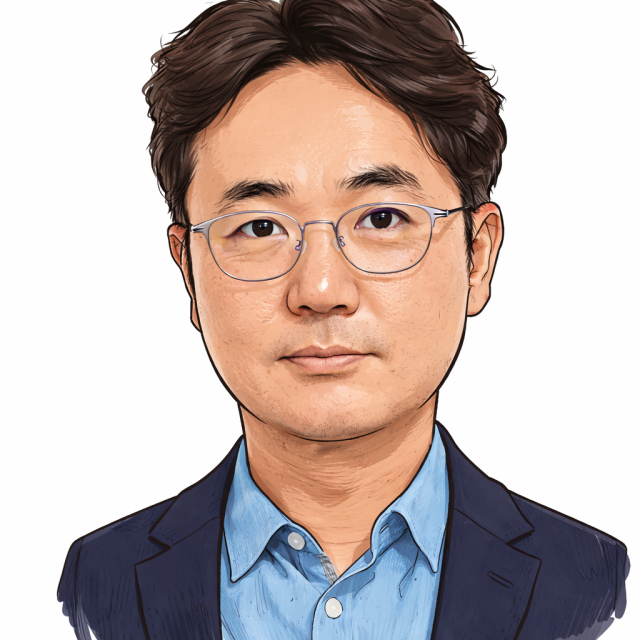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