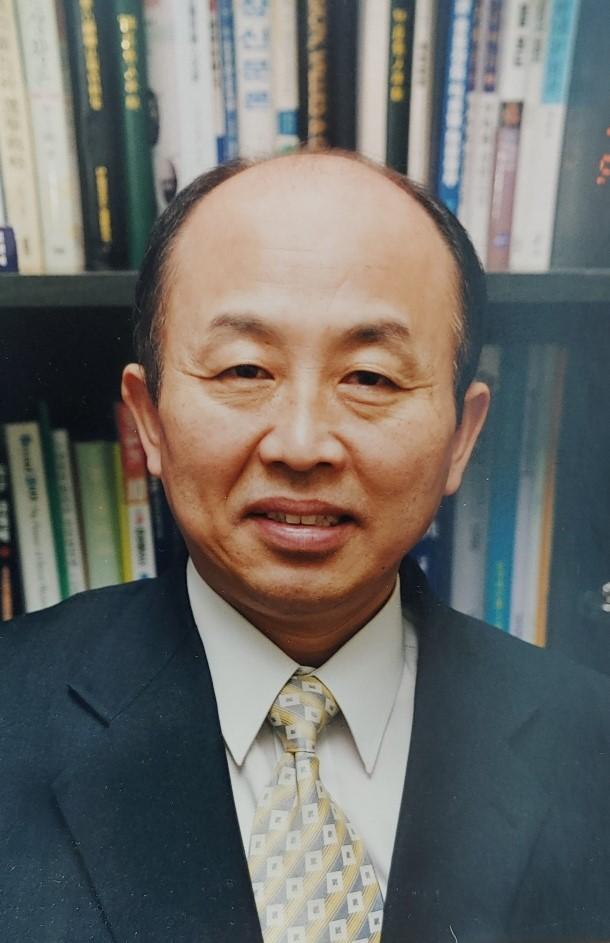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벼락출세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급전직하로 추락했다. 대통령에서 내란수괴로 몰려 수인(囚人)의 나락으로 떨어져 영어(囹圄)의 신세가 된 그의 운명은『주역』이 경고한 “하늘 끝까지 오른 용은 후회한다(亢龍有悔)”의 전형이었다. 최고 권력에 도달한 자가 겸손을 잃고 독선에 빠지면 결국 파멸을 자초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생생히 보여준 것이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권력의 문제’이다. 난세일수록 지도자의 판단과 통치술은 한 국가의 흥망을 가른다. 오늘날 민주정(民主政) 체제에서도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제도와 절차, 여론을 분석하는 현대 정치학의 틀로는 권력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국가 운영의 실제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극적으로 달라진다.
시대와 체제를 넘어, 권력자의 성향과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치 원리는 냉혹하다. 윤석열의 강압 통치는 자신을 파괴했고, 이재명은 이를 활용해 정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권력을 획득하는 창업(創業)보다 더 어려운 것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성(守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추락은 최고 권위에 오른 자가 자신을 절제하고 덕(德)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면, 권력은 언제든 ‘독(毒)’이 되어 자신을 삼킨다는 교훈이다. 역사는 이를 거듭 입증해 왔다. 사마천(司馬遷)은『사기(史記)』에서 항우(項羽)를 두고 “힘이 산을 뽑고 기운이 세상을 덮었으나(力拔山氣蓋世)” 결국 교병지패(驕兵之敗), 곧 오만이 부른 패망으로 귀결되었음을 기록했다. 윤석열의 궤적은 항우형 지도자의 전형을 닮았다. 결단과 추진력으로 정상을 향해 치고 올랐지만, 민심을 수성(守成)하지 못한 채 독주와 충돌을 거듭하다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에게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는 세력은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며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꿈꾸지만, 오만한 권력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정한지를 이미 숱한 역사에서 증명해왔다. 권토중래는 단순한 정치 복귀가 아니라 형세(形勢), 민심(民心), 천명(天命)의 삼위일체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즉, 윤석열의 재기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그는 검사로서 ‘권력운용’ 경험은 있었으나 포용과 절제의 통치술은 미흡했다. 대선 토론 과정에서 ‘확정적 범죄자’로 규정했던 이재명을 대통령 시절 면담하는 등 정치적 경쟁자와의 무분별한 화합 시도는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었고, ‘적과 동지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했다.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의 군주론의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경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윤의 몰락과 이재명 정권의 탄생은, 현대 정치의 한 장면이면서 동시에 최고 권력자들이 반복해 온 역사의 궤적이다. 대선에서 성공, 대통령이 된 윤이 내란수괴로 몰린 극적 반전이 이루어진 이 드라마는 권력운용의 고전적 원리를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실패를 넘어, 민주사회에서도 제왕학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웅변한다.
‘비상계엄’이라는 파천황(破天荒)의 자충수를 둔 윤석열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레토릭으로 ‘강직함’과 ‘법치주의 수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대권을 잡았다.
이는 ‘덕 없는 강권’이 필연적으로 부르는 자멸의 전형이다.『한비자(韓非子)』는 “군주가 권력을 쥐고도 민심을 잃으면, 그 칼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고 했다. 계엄령과 내란 시도 논란, 헌정질서의 위기, 민심의 격렬한 이반(離反)은 바로 이 경고의 실증이었다. 반면, 이재명은 난세의 정치 지형에서 ‘붕괴 작전’을 전술로 택했다.
범죄자만 상대하며 온실의 화초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평생 검사(23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갑(甲)으로 잔뼈가 굵은 윤석열은 풍찬노숙하며 산전수전 겪은 잡초형 생존 전략에 이골이 난 이재명의 매복전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不戰而屈人之兵)”을 상책으로 본다. 이재명은 정면충돌보다 윤석열의 자해(自害) 행보를 기다리며 민심을 흡수했다. ‘피의자’로 내몰린 법정 공방 속에서 ‘피해자 프레임’을 활용, 경제·민생 이슈에서 서민층의 불만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지지 기반을 확장했다. 정치적 맥락에서 ‘적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주도권을 빼앗는 전술’인 매복전을 시의적절하게 구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6계(計)’ 가운데 승전계(勝戰計) 네 번째 계책인 ‘편안함으로 피로함을 기다린다’는 ‘이일대로(以逸待勞)’로, 전장이 될 만한 곳에 먼저 도착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피로에 지쳐 도착하는 적과 싸우는 전술을 구사했다.
자기편 힘을 보존하고 적의 약점을 극대화,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적을 효과적으로 격파하는 이 전술은 ‘적의 피로와 자멸’을 기다리는 손자병법 지혜의 현대적 변용이었다.
‘군주의 자기 점검’, “동(銅)거울, 역사(古)거울, 사람(人)거울”
리더는 끊임없이 ‘성찰’을 통해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 조선 500여 년 왕조 지탱의 힘은 왕의 끊임없는 성찰과 왕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인 ‘경연(經筵)’ 제도였다. 신료들이 왕과 함께 학문과 국정을 토론, 왕의 독단과 전횡을 막아 왕이 '군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통치 철학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민심을 헤아리는 군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중국 최고 성군(聖君)으로 평가받는 태종(唐太宗) 이세민은『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신하 위징(魏徵)이 죽자 “동(銅) 거울, 역사(古) 거울, 인(人) 거울”로 성찰해 왔다고 고백했다.
• 동(銅) 거울: 제도와 법률을 상징한다. 지도자는 법률적 정당성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형을 단정히 하고, 국가 기틀을 확립한다. 통치 기본이자 최소 요건이다.
• 역사(古典) 거울: 역사 속 흥망성쇠를 통해 교훈을 얻는 도구다. 과거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 위기에 대비하는 지혜를 얻는다. 역사 반복성을 인지하고 과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성찰적 자세를 의미한다.
• 사람(人) 거울: 인재와 신하 충언을 통해 자신의 득실을 살피는 지혜를 상징한다. 가장 얻기 어려운 거울이며, 지도자의 오만을 경계하게 한다. 자신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직언을 경청하는 능력은 지도자의 그릇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윤석열의 리더십은 첫째 거울, 즉 법률적 정당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법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모든 문제를 법률적 잣대로만 재단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단순히 합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정서적 공감대와 시대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 행위다.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낫지만, 두려움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 그는 파멸한다”고 경고한 마키아벨리 지적대로 윤석열은 법 집행의 엄격함으로 일정 부분 국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둘째 거울(역사의 교훈)과 셋째 거울(충언)을 외면한 결과, 그의 통치 방식은 국민에게 점차 증오의 감정을 유발했다. 민심은 단순히 법의 잣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공감과 소통이 부재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반발에 부딪힌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빌리자면, 지도자의 독선은 반작용(反作用)을 낳아 결국 새로운 변화의 동력(動力)이 된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지도자의 자기 성찰 부재가 초래하는 비극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검사형 리더십의 태생적 한계
윤석열 리더십의 핵심은 검찰 조직문화였다. 위계(位階)질서 속의 충성, 상명하복, 법률 중심 사고가 국가 운영에 그대로 이식되었다.『자치통감』은 “장수가 무능하면 삼군이 연좌된다(將帥無能, 累及三軍)”고 했다.
지도자의 사고방식이 조직 전체를 규정하듯, 검사형 리더십은 국정 운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검사형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단죄와 책임 추궁에는 능하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은 취약하다. 정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타협을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법률적 판단은 명확한 결론을 요구하지만, 정치는 모호함 속에서 최선의 합의를 찾아야 한다.
둘째,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다. 법정에서는 유죄·무죄만 존재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회색지대’가 훨씬 넓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세력을 '적폐'나 '카르텔'로 규정, 대결 구도를 심화시켰다. 정치적 스펙트럼을 단순화, 협치 여지를 없애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를 선호한다. 검찰조직에서 익숙했던 하향식 지시 체계는 정치적 소통을 가로막고, 수평적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방해하고, 결국 고립된 의사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의 계엄령 실패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인형 리더십과 대비된다. 박정희는 군사적 과단성과 함께 필요할 때는 정적을 포용하거나 정치적 거래를 통해 정국을 장악했다. 1960년대 한·일협정 당시, 반대 여론에 직면했을 때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동시에,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야 세력과의 밀실 협상을 병행했다.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결단력과 함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윤은 이와 달리 정치적 연합 구도를 형성하지 못했고, 비판 세력을 포용하기보다 적으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
막스 베버(Max Weber)가『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강조했듯, 정치는 단순한 관료적 행정이 아니라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행위다. 윤의 검사형 리더십은 관료적 책임감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치의 본질을 놓쳤다.
충언 배제와 내부 붕괴의 전조(前兆)
권력의 몰락은 외부 공격보다 부식(腐蝕)된 내부 붕괴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는 고대의 난세에서부터 반복된 ‘정치 철칙(鐵則)’이다. 윤석열의 몰락도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동훈 등 내부 배신에서 조짐을 보여 단순한 권력투쟁 패배나 여론 악화로만 치부할 수 없다.
권력자 주변에 아첨꾼이 모여들고, 충언하는 신하 배척 현상은 역사 속에서 반복됐다. 윤 정권 후반에 불거진 핵심 측근 이탈과 배신은 권력 기반의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한비자』도 “근신들은 아첨을 공으로 삼는다(近習之臣, 皆以讒諂為功)”고 경고했다.
윤의 몰락은 3류급의 무능 무위한 참모 임용 등 ‘인사가 만사’임을 외면한 권력 운용 결과로 해석되며, 곧 ‘거울 없는 권력’의 필연적 파국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권력의 비판적 자기 성찰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어떤 재앙이 초래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역사적 사례는 왕망(王莽)의 신(新) 왕조다. 그는 유교적 명분을 내세워 혁명적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자신의 개혁 노선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측근들만을 가까이했다. 충언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아첨꾼만을 중용,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남발했다. 결국 대규모 농민 반란과 내부 분열로 신 왕조는 짧은 역사를 마감해야 했다.
사마천은 “신임이 부당하면 나라가 기운다(信任 不當, 國必傾危)”라고 했다. 윤은 비판 목소리를 내는 인물을 멀리하고, 오직 ‘충성 경쟁’을 하는 측근을 중용한 후과를 단단히 치르고 있다. 이는 권력 스스로가 자신을 갉아먹는 ‘자가포식(self-cannibalization)’을 초래했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차단된 권력은 현실을 왜곡해 보게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다.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는 “권력이 다른 사회 시스템(경제, 문화 등)과 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화될 때, 시스템 전체 균형이 깨져 붕괴하게 된다”고 했다. 윤의 충언 배제는 권력이 사회 시스템과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끊어버린 결과다. 염량세태(炎凉世態)를 반영하듯 외면하고 냉대하는 세상인심이 부박(浮薄)함을 탓하는 ‘고립무원’이라는 그의 법정 넋두리가 한심할 뿐이다.
박종렬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철학과 ▷중앙대 정치학 박사 ▷동아방송·신동아 기자 ▷EBS 이사 ▷연합통신 이사 ▷언론중재위원 ▷가천대 신방과 명예교수 ▷가천대 CEO아카데미원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