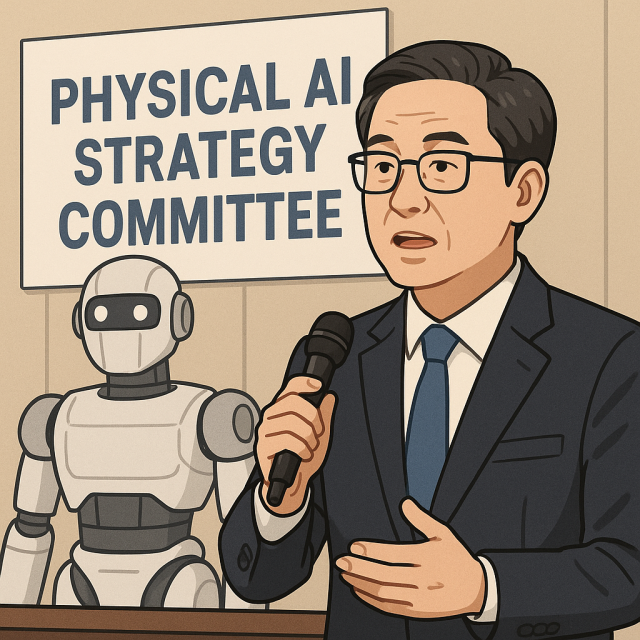
국내 피지컬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이를 전담할 '피지컬 AI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피지컬 AI 산업·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AI와 로봇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피지컬 AI 전략위원회'와 같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연구개발 투자, 규제 혁신, 글로벌 협력 등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공공 현장에서 실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범부처 협력 체계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해당 위원회가 기획부터 예산 확보, 사업 집행까지 전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류로봇·제조 자동화·스마트시티 기반 피지컬AI 등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증 과제도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이 같은 제언은 글로벌 주요국이 이미 피지컬 AI 영역에서 전략 수립과 투자를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지능형 로봇 및 자율시스템(IRAS)' 연구개발(R&D)를 통해 지난 2023년 5380만 달러, 2024년 69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국방부(DOD) 역시 '자율성·로봇 기술 관련 개발·시험·평가(RDT&E)' 및 조달 부분에 대해 지난 2023년 103억 달러, 2024년 102억 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에는 피지컬 AI 관련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관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 '중국제도 2025'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로봇 제품의 고도화·핵심 부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부터는 '지능형 로봇 중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약 4340만 달러,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52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일본은 경쟁국에 뒤처진 초기 산업용 로봇 선두 자리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문샷 연구 개발 프로그램'으로 약 4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오는 2050년까지 인간과 함께 공생하는 AI 로봇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핵심이 개별 기술 경쟁이 아닌아닌 생태계 경쟁에 있다고 짚었다. 단일 기술 개발보다 시장-서비스-인프라-부품-기술을 잇는 밸류체인 전반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지금의 기술 패권 경쟁은 생태계 싸움”이라며 “TSMC나 중국이 강한 것도 개별 기술보다 시장·기술·생산의 통합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도 국내에서 만든 기술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수출형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고,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먼저 정의한 뒤, 거기에 맞게 기술과 인프라를 거꾸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