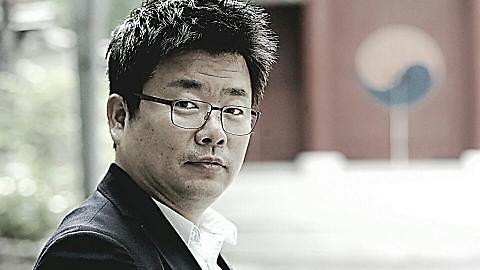
조커의 도시 고담은 정글이다. 그곳엔 인간이란 단일 종족이 산다. 외형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들은 사회계층에 따라 세분된다. 사실상 여러 종족이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서 플렉은 최하층에 속한다. 비쩍 마른 체구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피에로 분장을 한 그는 어린 종족들의 발에도 차인다. 어린 종족이 아서 플렉에게 공격성을 보인 건 그가 단지 나약해 보여서다. 반격이나 복수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선한 아서 플렉은 여러 종족들에게 물리고 뜯기며 결국 살인마 조커가 된다. 그가 방아쇠를 당긴 건 자신이 살기 위해서다. 정당방위다. 조커는 성선설에 기반해 만들어진 캐릭터지만, 고담이란 정글은 어린 종족마저 재미로 자신보다 나약한 종족을 공격하는 성악설이 지배한다. 선한 개인과 악한 사회란 이중구조는 악의 탄생이 사회 구조적 문제란 점을 부각시킨다.
◆구조화된 초양극화··· 그 결말은?
영화가 악의 탄생을 구조화된 초양극화의 부산물로 정의한 것은 살인마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의도가 아니다. 지금의 사회구조가 지속되면, 악의 탄생은 필연적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2090년이 되면 중산층은 화석에서나 찾을 수 있는 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공대 유기윤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90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0.003%의 플랫폼 소유주와 플랫폼 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99.997%는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프레카리아트, 즉 불안한 계층으로 전락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된 초양극화의 결과다. 생산성이 극대화된 AI(노동력)를 무한 생산할 수 있는 재벌만이 플랫폼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노동자들 간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국감 기간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0.1% 상위 소득자 1만8005명의 총소득은 하위 17%인 324만명의 총소득과 맞먹었다.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8억871만원으로 중위 소득자의 31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를 다룬 소설 '종의 기원'을 쓴 이유를 "앞으로 이런 살인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라고 했다.
◆조커의 대량생산, 막을 수 있을까?
조커의 탄생에 군중이 열광하는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베트맨이 탄생했다. 성난 군중이 당긴 방아쇠에 쓰러진 토마스 웨인 부부 옆에서 통곡했던 유일한 생존자 브루스 웨인. 그가 바로 고담시를 구할 영웅 베트맨이 된다.
브루스 웨인은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브루스 웨인과 아서 플렉의 가장 큰 차이는 막대한 상속 재산이었다. 브루스 웨인에겐 충직한 집사와 평생 먹고살 걱정 없는 유산이 있었다. 그냥 타고 다녀도 좋은 차를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베트카로 튜닝하고, 방탄이 되고, 심지어 근거리는 날 수 있는 특수 의상도 제작할 만큼 충분한 돈이었다.
아서 플렉에겐 자신을 학대하는 계부와 그를 방치하는 엄마가 전부였다. 망상에 시달리는 엄마를 먹여살리기 위해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구두닦이 통을 메고 고담시 골목을 누비며 유년시절을 보냈을 게 뻔하다. 계부의 구타로 괴기하게 웃는 그에게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거부와 부정, 좌절은 그의 삶에선 일상적인 일이었다. 토마스 웨인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기대는 엄마의 망상으로 밝혀지고, 코미디언이 될 것이란 꿈은 조롱거리가 됐다. "내 삶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다"는 아서 플렉의 대사는 웃픈 그의 현실을 대변한다.
좌절의 반복으로 악은 결국 탄생한다. 실제 양극화는 범죄율·자살률·이혼율 등 대표적 사회갈등 지표를 악화시킨다. 한국은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는 1990년 2741건에서 2009년 4356건으로 1.6배 많아졌다. 같은 기간 살인건수는 1.8배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은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
국회 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2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은 갈수록 자살률이 줄어드는데 한국은 유독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에선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20~30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가 넘는다. 자살 미수자들이 말하는 자살 시도 이유는 대부분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알 수 없어서"라고 한다.
허종호 연구위원은 "뒤르켐이 100년 전 '자살론'에서 이미 자살이 사회병리 현상임을 밝혔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범죄자와 자살 시도자를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과 개인의 악행으로 보는 관점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아서 플렉이 자신의 조커가 된 이유를 "사람들이 나에게 상냥하지 않아서"라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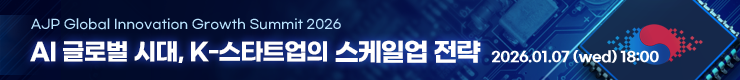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