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블(Bubble)'이란 단어엔 기본적으로 공포심리가 내재돼 있다. 거품이 한껏 부풀어오를 때는 모두가 행복하지만 그게 터지는 순간은 모두에게 지옥이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렵다. '뻥' 하고 터지고 나서야 체감한다. 그래서 버블이란 단어는 사후적이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버블이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 멀게는 1929년 미국 대공황, 가까이는 2000년 IT 버블(닷컴 버블)이 있었다. 그때마다 증시는 지옥을 경험했다. 공포에 질린 이들이 앞다퉈 투매에 나서는 통에 시장은 붕괴됐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 뉴욕 증시는 2개월 만에 40% 이상 추락했다. IT 버블 당시 코스피는 50.92%(2000년 1월 초 1028.07→12월 말 504.62), 코스닥은 79.47%(2561.40→525.80) 급락했다. 전 재산을 털어서 혹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던 수많은 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던 시절이었다.
2025년 11월 우리는 다시 한번 '버블'이란 단어를 접하고 있다. 이른바 'AI 버블'이다. 2022년 하반기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를 뒤흔든 AI 열풍에 '거품'이 꼈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불을 지폈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앤드루 로스 소킨이 "지금 월스트리트는 1929년 시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기름을 끼얹었다. 즉각적으로 AI 시대 두 선구자인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버블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I 버블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뜨겁다. 버블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도 증시는 잠깐 주춤했을 뿐 다시 4000 고지를 넘어섰다. 그 와중에 증권사들은 점점 더 대담해진다. 매일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은 이제 코스피 5000 시대 도래를 당연시한다. 한술 더 떠 코스피가 7500까지 갈 수 있다는 '예언급'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도 있다.
더 이상 '닥터 둠(Dr. Doom)'이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한국 증시다. 그래서일까. '빚투'는 가열차다. 일주일 새 1조원 넘는 돈이 증시로 몰렸다. 주식활동계좌 건수는 1억개 돌파를 앞뒀고 주식 투자자는 1500만명에 육박한다. 전 국민 3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물리학에 '무한동력'이 없듯이 무한 상승하는 증시는 없다. 1500만 개미들이 모두 행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다들 안다.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의 손실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적어도 잘나가는 K-증시에 낀 착시(錯視)의 위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코스피 상승분 중 30%가량이 반도체 등 일부 대형주 몫이라는 점, 사천피 시대에도 절반에 가까운 종목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이 20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를 말이다.
그래서 유감이다. '적정한 수준'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빚내서 투자해도 괜찮다"는 금융 고위관료의 발언은 지나치다. 정부·여당은 코스피 지수가 지지율과 등가(等價)인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 증시가 주춤할 때마다 추가 상법 개정안을 '불쏘시개'처럼 내놓는다. 11일엔 대통령이 개미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마냥 들떠 있을 게 아니라 빚투에 나선 개미들 걱정도 해야 한다. 그게 정부·여당이 할 일이다. '닥터 둠'은 아니더라도 '미스터 돌다리' 정도의 신중함은 갖춰야지 않을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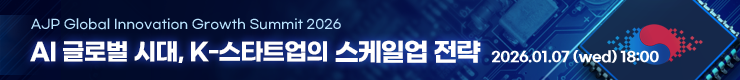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