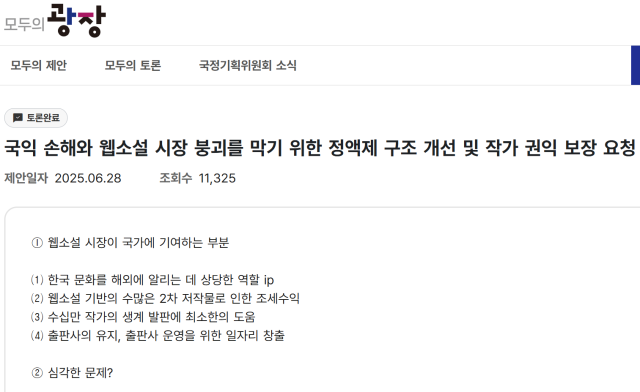
밀리의 서재가 웹툰·웹소설 정액제(구독형) 서비스 도입에 나서며 기존 회차당 과금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던 작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밀리의 서재측은 정액제 도입으로 더 많은 이용자가 웹툰, 웹소설을 소비하며 종전 수익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지만 작가들은 회차당 100원의 수익이 0.01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9일 웹소설 작가들이 연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린 '웹소설 정액제 구조 개선 및 작가 권익 보장' 국민 제안이 1600회 이상 추천 받았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제안은 정액제 모델이 창작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작가들은 정액제 구조에서는 독자들의 열람이 많아도 수익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다며 생계 위기를 호소한다. 작품 단위 수익이 노출도나 열람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작품이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정산 기준에 따라 예상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발간한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웹소설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플랫폼은 카카오페이지(24.5%)였고, 이어 네이버 시리즈(18%), 리디(15.8%), 조아라(15.6%) 순이었다.
웹툰·웹소설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지와 네이버웹툰 등은 회차당 과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기준 웹툰은 한 화당 약 200원, 웹소설은 약 100원 수준이다. 이용자는 원하는 회차만 결제해 열람하며, 수익은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가 나눈다.
반면, 밀리의 서재 등 일부 플랫폼은 출판사 등 1차 플랫폼에서 유료 콘텐츠를 공급받아, 자사에서는 월정액 구독형 모델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양한 웹툰·웹소설을 무제한으로 열람할 수 있다.
작가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개별 회차 결제가 사라져 수익 정산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산은 열람 횟수나 노출 순위 등 플랫폼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작가들에 따르면 구독형 모델에서는 작가 수익이 회차당 과금 방식의 1/3 수준에서 추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하락한다. 정액제가 되면 글의 가치가 회차당 0.01원으로 책정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측은 이러한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밀리의 서재 관계자는 "플랫폼은 출판사와 계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작가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정산 기준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구독형 서비스라도 열람 횟수가 많아지면 정산 금액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작가가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의 콘텐츠 특성상 정액제 구조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웹소설과 웹툰은 회차 단위로 소비되고 금액이 소액이고 소비 속도가 빠르다"며 "지난 20년간 다양한 수익 모델이 시도됐지만, 회차별 과금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