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호택 아주경제 논설고문 겸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노회찬 의원에 대한 거대한 추모의 물결을 보며 두 달 전 작고한 김종필(JP) 전 총리의 추모객과 비교하는 이도 있었다. 시대를 바꿔가며 2인자의 삶을 살고,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한 시대를 풍미한 JP는 세속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족적에서 노 의원과 비교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행로가 180도 다른 두 사람의 정치사에서 2004년 17대 총선은 희한한 대결을 만들어냈다. 자민련은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유표득표의 3%)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 1번이던 김 총재가 10선의 영광을 놓치고, 그 바람에 민주노동당 8번이던 노 후보가 턱걸이로 당선됐다.
장례식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꽃을 바치는 추모객의 긴 행렬은 서민과 노동자의 표상으로서의 삶에 대한 사회적 존경의 표시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인기스타 중의 스타였다. 현실정치를 꿰뚫는 촌철살인으로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두 번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 두 번이 나와 그의 만남의 전부다. 신문사 논설위원 시절 신동아에 ‘황호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를 6년여 동안 한달도 거르지 않고 연재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4년 6월호에 실린 노회찬 인터뷰를 다시 꺼내 읽어 보았다. 200자짜리 원고지로 150장 분량이나 되는 장문의 인터뷰였다.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 죽음에 관한 노회찬의 철학이 나왔다. 이 대목을 읽으며 나는 그의 죽음은 정신세계 깊은 곳에 자리잡은 인생관과 관련이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평소 자주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 ‘잘못돼 봤자 죽기밖에 더하겠냐. 우리가 죽는 것도 겁 안 나는데 뭐가 겁나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철학입니다”라고 답했다.
경기고에 다닐 때 유신반대 운동부터 시작해 1982년부터 7년 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고 늘 불안 속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다. 1989년에는 마침내 체포돼 2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검사의 권유대로 ‘반성문’을 썼더라면 일찍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노회찬답지 않은 선택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죽기를 겁내지 않는 인생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묻자, 그는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답했다. “남들 편하게 지낼 때 엄청 고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고생보다 훨씬 더 큰 행복도 많았습니다. 여한이 없어요. 20대, 30대는 물론이고 40대까지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정도 생겼지요···.”
인터뷰 도중에 부인에게서 전화가 두어 번 걸려왔다. 총선 후 처음으로 인천에서 처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라고 했다. 오후 7시 약속이라는데 인터뷰가 길어져 8시를 넘기고 있었다. 부인의 성화가 심한지 “당신이 전화를 안 끊어서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채널A의 뉴스 토크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을 때도 한번 출연했다. 그때 진보 쪽의 정치인들은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그가 정치부 기자를 통해 출연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의 정치적 여유와 사고의 폭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4년 전에 ‘여한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던 그는 3선이 됐고, 그를 빼고 한국의 진보정치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사회적 축적을 이루었다. 이쯤에서 그는 드루킹 수사로 상처 받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는 대신에 마지막 선택을 한 것 같다.
노 의원의 범죄혐의는 고교 동창인 드루킹 측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이었다. 2016년 총선에서 창원에 출마해 선거자금이 궁할 때였다. 현역 의원처럼 합법적으로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정치자금범 위반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죽기밖에 더하겠나” 하는 용기로 엄혹한 세월을 견뎌냈다는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노 의원과 당을 함께했던 C씨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당내에서도 탈당 압박 등이 있었다. 그는 당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아닌데도 정의당과 지지자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죄한 것 같다. 법정에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나서도 “나는 무죄”라고 강변하는 얼굴 두꺼운 정치인들과 노회찬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살아온 격정의 삶 앞에서는 머리가 숙여지지만 그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에는 반대한다. 죽기 전에 유서에 남긴 것처럼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의원직을 던지면서 사법절차에 응했더라면 지금처럼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지는 않았더라도 “노회찬은 역시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빠져들었을 치열한 고민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를 또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길밖에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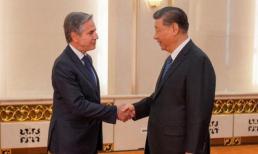






![[포토] 석촌호수에 나타난 포켓몬 라프라스와 피카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155410280572_388_136.jpg)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003606867599_388_136.jpg)
![[포토] 최정, 한국 야구 역사 468호 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232935147850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입생로랑 뷰티 팝업 방문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84737983118_388_136.jpg)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