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05명이 12일 학교 대강당에서 '제5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씨는 투신 직전 연신 줄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태움'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실수로 환자의 배액관이 망가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박씨의 남자친구는 "간호부 윗선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움'이라는 것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태움은 신입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칭하는 은어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우듯 괴롭힌다는 뜻에서 비롯됐다. 태움에 대한 지적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병원과 간호사 집단의 특수성을 감안,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구분해 진행한 연구 또한 다양하다.
실제로 태움을 경험한 간호사들을 대면 인터뷰한 정선화 서울대 간호대학 대학원 교수(간호사의 태움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2016)와 이윤주 인천재능대 간호과 교수(직장 내 괴롭힘 개념 개발: 병원간호사를 중심으로·2014)의 논문 내용을 토대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가상의 간호사 A의 하루를 재구성했다.
오전 5시 출근길. 잠이 부족한 탓인지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겁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A는 "그냥 확 사고를 내고 병원에 가지 말까"라고 혼자 읖조린다. A가 ○○병원에 들어온 건 두 달 전. '국내 최고'라는 명성에 이끌려 입사했을 때만 해도 큰 꿈에 부풀었던 A의 환상이 깨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신입 간호사들은 입사와 동시에 '프리셉터(preceptor)'라고 불리는 선배 간호사와 짝지어진다. 신입들은 선배로부터 입사 후 3개월 가량 혹독하게 병동 업무를 교육받는다. 그러나 A는 자신의 프리셉터 B가 교육을 빙자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듣는 "병X 같은 게… 접시에 코 박고 죽어라"는 B의 입버릇에 어떤 교육적 의도가 있는지 A는 이해할 수 없다.
아슬아슬하게 오전 6시에 도착했다.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은 보통 3교대 체제로 근무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데이',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는 '이브닝',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나이트'로 나뉜다. A는 오늘 데이 타임이지만 1시간 일찍 출근했다. 쓸데없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병원에 온 A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물품 카운트다. 의료 장비와 기구, 비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한 번은 B가 찾아오라는 물품을 못 찾아서 크게 혼이 난 적이 있다. 한참을 뒤지다가 "못 찾겠다"고 말하자 B는 기다렸다는 듯이 장부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것도 못 찾아내면서 무슨 물품 카운트를 다 했냐고." 다른 간호사들에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B가 가져오라던 물품은 원래 없었다고 한다.
오늘 담당해야 할 환자들을 확인한 뒤에는 전체 인계 차례다. 오전 7시 정각. 최고참에 해당하는 수간호사 1명과 나이트 근무 간호사들에게 병동 전체의 공지 사항은 물론 환자 정보를 전달받는다. 30명이 넘는 환자들의 정보를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 안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 하나라도 놓치면 태움의 시작이다.
환자들도 다 안다. 얼마나 큰 소리로 혼내는지 병실 안에도 다 들릴 정도다. 사소한 실수에도 선배들은 거침이 없다. 심지어 환자 앞에서도 "너 뭐하는 거야? 한심하다, 한심해"라며 소리치기 일쑤다. 한 보호자가 "아침 먹고 짖고, 점심 먹고 짖고. 여긴 왜 이렇게 무서워?"라고 물었을 때는 A는 간신히 눈물을 삼켰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신청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A는 금방 마음을 접었다. '입사 후 몇 년 동안은 부서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간혹 부서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병원 내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일을 못 하길래 여기까지 오냐"는 수군거림이 계속됐다. 한 번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들은 오래 안 가 병원을 그만뒀다.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나면 A의 일과도 끝이다. 그러나 A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다른 간호사들은 퇴근 뒤 행선지를 정하느라 호들갑이다. 누구도 A에게는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A에게 잘 가라는 말을 남기고 우르르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A는 자신에게도 낙인이 찍혔다는 확신이 들었다.
갑자기 A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간호사로부터의 전화다. 오늘 저녁에 있는 병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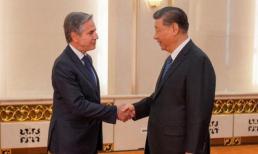






![[포토] 석촌호수에 나타난 포켓몬 라프라스와 피카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155410280572_388_136.jpg)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003606867599_388_136.jpg)
![[포토] 최정, 한국 야구 역사 468호 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232935147850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입생로랑 뷰티 팝업 방문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84737983118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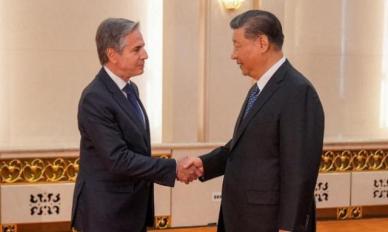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