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에서 근무하는 김이수씨가 배달할 순서에 따라 탑차에 배송할 박스들을 쌓고 송장을 확인하고 있다.
김이수(40)씨가 서울 잠실동 한신코아 오피스텔에 도착해 탑차에서 배송할 박스들을 내리자 입구를 나오던 주민이 대뜸 말을 건넨다.
CJ대한통운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송장도 보지 않고 "오늘은 2개 뿐이네요"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 지역에서 오래 배달했기 때문에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름과 호수를 외우고 있는 것이다.
◆ 추석 대목, 하루에 300개 이상 '배송전쟁'
처음부터 실수 연발이다.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 맨위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한 건도 배송 못하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오르 내리는데 추석 선물세트가 많아 엘리베이터 턱에 걸려 짐이 우르르 쏟아지기도 했다.
"택배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배달지의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다. 처음부터 허탕이다. 배달을 끝내고 1층에 빈몸으로 가볍게 도착하고 싶었지만 역시 세상일은 뜻대로 되는게 없다.
두번째 집의 벨을 누르자 집 주인이 문을 빼꼼히 열더니 택배를 휙 받고 들어가 버린다.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바랬던걸까. 허탈했지만 그래도 짐 하나가 줄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가벼워 진 것 같다.
다음집은 벨을 누르자마자 문이 갑자기 열려 당황스러웠다. 벨을 누르는 순간 마침 외출을 하려던 집주인이 문을 연 것이었다.
택배 기사 김씨의 배송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이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기자가 자주 가는 출입처 바로 옆이다. 평소에 자주 가던 푸르지오 월드마크 주상복합, 지하상가 음식점, 홈플러스, 장미아파트 등 평일에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익숙한 곳이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기자를 봤다면 이직한 것으로 알았을 지도 모른다.
추석 대목을 맞아 김씨가 지난주 토요일 기자와 배달한 택배는 300여개 이상이다. 추석 한 주 전인 이번주는 350개까지 늘어난다.
배달 도중에는 쉴 틈이 없다. 김씨는 배달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전화를 걸어 고객이 집에 있는지 확인했다. 고객이 집에 없으면 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다. 들고 다니는 짐의 무게와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2동 배송을 마치고 잠시 목을 축이며 담배를 태우는 2~3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다.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한진택배 기사와 짐을 내리면서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며 서로를 견제하기도 한다. 물건이 조금 남은 사람은 승자의 미소를 띄우고, 많이 남은 사람은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 진상 손님 많지만 음료수 건네는 고마운 손님도
김씨가 소속된 송파지점의 하루 일과는 오전 7시에 시작한다. 전국 곳곳에서 온 택배가 도착하는 시간이다. 이날 송파지점에 도착한 택배는 3만개다. 명절 바로 직전에는 3만5000개까지 늘어난다.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동하는 택배들을 각자의 배송지에 골라내는 작업.
김씨는 "택배만큼 정직한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배달 건당 보수를 받기에 발로 뛴만큼 자신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들과의 배달과정에서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생긴다.
한 직원은 배송이 하루 늦었다고 "우리 아들이 ㅇㅇ지검장인데 배송을 이런 식으로 하냐"며 뺨을 때리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 택배 안에 뭐가 있는지 묻는 손님도 있다. 배송만 하는 기사들이 알리 만무하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신선식품 등 바로 배송해야 하는 물건을 받아야 하는 손님이 전화를 안 받을 때다. 배송을 못하면 내일 또 들고 나와야 하고 상할 수도 있다.
많은 애로 사항이 있지만 막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음료수를 건내는 고마운 손님도 있다. 그러면 한여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들이키곤 한다.
김을한 CJ대한통운 송파지점장은 "어떤 기사는 배달 중 시간도 부족하고 화장실 이용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요강을 들고 다니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차에 배달되는 순서대로 쌓여있는 택배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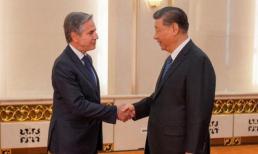






![[포토] 석촌호수에 나타난 포켓몬 라프라스와 피카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155410280572_388_136.jpg)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003606867599_388_136.jpg)
![[포토] 최정, 한국 야구 역사 468호 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232935147850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입생로랑 뷰티 팝업 방문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84737983118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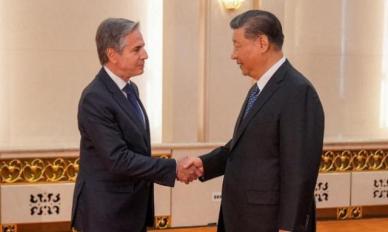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