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장안(長安)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남쪽의 강주사마(江州司馬)로 좌천되었다. 친구를 배웅하는 사이, 한 여인의 비파 소리를 듣게 된다. 처연한 선율에는 그녀의 인생역정(人生歷程)이 모두 담겨 있었다. 장안의 명기(名妓)로서 귀족들과 어울려 지낸 젊은 시절이며, 상인의 아내로 살고 있는 지금의 영락한 처지까지 모두 비파 소리에 얹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끊긴다. 연주하는 이의 마음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음(知音)이라 했던가. 백거이는 이 여인의 ‘소리 없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리고 읊조린다.
별유유수암한생(別有幽愁暗恨生) 따로 그윽한 시름 있어 남모르는 한이 이니
차시무성승유성(此時無聲勝有聲) 이때는 소리 없는 게 소리 있는 것보다 낫지
-백거이(白居易·772~846), <비파행(琵琶行)> 중
울울한 심정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상대방이 따뜻한 시선으로 묵묵히 들어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는 소리 없는 비파가 사람을 더욱 감동시키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아마도 한번쯤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비 오는 저녁, 서로 술잔을 기울일 땐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뜻하지 않은 삶의 생채기엔 무덤덤하게 등을 도닥여주는 손길이 백 마디의 말보다 나은 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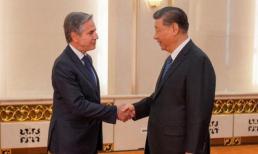






![[포토] 석촌호수에 나타난 포켓몬 라프라스와 피카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155410280572_388_136.jpg)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003606867599_388_136.jpg)
![[포토] 최정, 한국 야구 역사 468호 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232935147850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입생로랑 뷰티 팝업 방문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84737983118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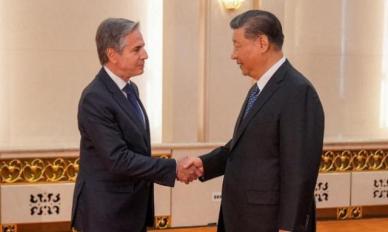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