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상훈 기자]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7일 한 출판사 대표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를 때마다 몹시 뿔이 난다"며 "서점에 비치된 책들은 출판사가 '팔기 위해' 가져다 둔 것이지 '읽고 가라'고 둔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게 도화선이 됐다.
실제로 서울 시내 주요 대형서점 몇 곳만 돌아봐도 대형 테이블, 간이의자 등의 공간은 물론이고 진열대 사이사이 통로에 빽빽이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새로 개장하거나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점하는 매장들은 '고객편의' '독서친화' 등의 콘셉트를 앞세워 다양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서점의 최신 트렌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대형서점과 위탁판매로 거래하는 출판사들은 팔리지 않은 '더러운' 책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되돌려 받는 것과 매장 내 도서 진열 공간이 줄어든 게 못내 아쉽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최대 100명이 이용 가능한 대형 테이블이 설치되며 5만여권의 책이 매장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A씨가 "남의 책으로 생색내면서 독자 서비스를 베푸는 양 하지 말라"고 대형서점을 나무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발품을 파는 것은 직접 책을 들춰보며 자신이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함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서점은 '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결국 독서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서점 측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대형서점들이 견본 책을 따로 구매해 출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도서관을 확충해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대형서점이 출판사들을 배려하고, 책 살 돈이 여의치 않지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 역시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서점의 도서관화'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서점 테이블에 몇 시간이고 앉아 마치 자신의 참고서인 양 손톱으로 밑줄을 긋고, 다음에 또 읽기 위해 소설 한 쪽 귀퉁이를 접어두는 독자들이 있는 한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책을 배려하는 습관이 먼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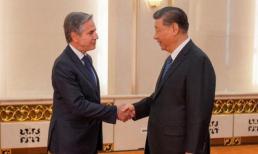






![[포토] 석촌호수에 나타난 포켓몬 라프라스와 피카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155410280572_388_136.jpg)
![[포토]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6/20240426003606867599_388_136.jpg)
![[포토] 최정, 한국 야구 역사 468호 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232935147850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입생로랑 뷰티 팝업 방문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84737983118_388_1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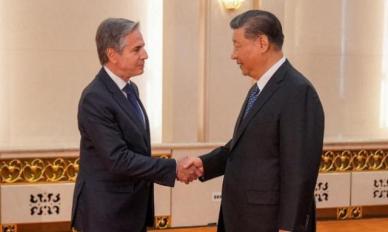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