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몽골의 인구는 300만명을 약간 넘는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칭기즈칸은 생전에 영토로 대제국을, 사후엔 유전자로 대제국을 세운 것이다. 아마도 그 일등 공신은 셋째 아들 오고타이일 것이다.
칭기즈칸에 이어 몽골 제국의 칸(汗)이 된 오고타이(몽골 발음 우구데이)는 여자와 술을 너무 좋아했다. 황후와 황비가 아홉이지만, 그보다 애주가로 더욱 유명하다. 보다 못한 차카타이가 나섰다. 그의 둘째 형이다. “위대한 칭기즈칸이 세운 제국을 술로 망치려 하느냐”고 질책하며 하루에 술을 몇 잔이나 마시는지 감독할 관리를 곁에 두도록 했다.
이에 오고타이는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시겠다”고 약속한다. 차카타이가 돌아가자마자 신하를 불러들인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잔을 만들어라.” 바로 ‘오고타이 술잔’의 유래이다.
‘한 잔’의 ‘한’은 그래서 다중의미이다. 숫자로는 하나이지만, 본디 ‘한’에는 '위대하다' '크다'는 뜻도 있다. 대한민국의 ‘한’처럼 말이다. “가볍게 한 잔 하세~”가 절대로 가볍지 않은 이유이다.
다산 정약용은 ‘한 잔’의 위험성을 일찍 알아차렸다. 박석무 선생이 펴낸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산은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정작 주량은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가 벼슬하기 전이다. 정조(正祖)가 원자를 위해 지은 중희당(重熙堂) 글 솜씨 대회에서 일등을 세 번 했다고 자랑한다. 부상은 옥으로 만든 필통에 가득 담은 소주였다. 그는 “오늘 죽었구나 했는데,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고 썼다.
하루는 춘당대(春塘臺)에서 왕과 학사들이 어울려 ‘맛난 술’을 커다란 사발로 마셨다. 대부분 곤드레만드레 정신을 잃어 몇몇은 남쪽을 향해 절을 하고, 몇몇은 자리에 누워 뒹굴었다고 한다. 원래 임금은 북악산 아래 있어 신하는 북면하여 절을 하는 것이 법도인데 말이다.
그런 다산이 자녀들에게는 ‘반 잔’을 제시한다. 술 맛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는 것이다. 소가 물을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절대 술 맛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입술과 혀에 적시지 않고 바로 목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맛을 알겠느냐 반문한다.
술의 정취는 살짝 취하는 데 있다고 했다.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구토하며 잠에 곯아떨어진다면 과연 무슨 정취가 있느냐는 것이다.
목민관으로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행정+사법공무원인데, 청렴(淸廉)을 앞세워 이른바 ‘김영란 법’을 경계했을까. 술이야 청탁(淸濁) 불문이지만, 관리에게 청탁(請託)은 예나 지금이나 불가(不可)이다.
‘반 잔’을 예찬한 다산은 ‘뿔 잔’을 소개한다. 공자(孔子)가 제자에게 권했다는 ‘각잔(角盞)’ 말이다. 도자기 잔에 뿔이 달려 있어 한꺼번에 마실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어쩌면 공자는 제(齊) 환공(桓公)의 ‘계영배(戒盈杯)’를 떠올렸을 것이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 말이다. 잔 밑에 구멍이 있어 7할 이상 채우면 모두 흘러나가게 설계돼 있다고 한다. 곧 인간의 끝없는 욕심, 과욕을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굳이 ‘계영배’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반쯤 찬 술잔을 보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구나” 스스로 되뇌면 되지 않을까.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조바심 내지 말고. 그러면 ‘반 잔’은 ‘마음속의 계영배’가 되지 않겠나.
술잔을 뜻하는 ‘배(杯)’는 나무로 만든 형상이다. 속자로 함께 쓰이는 ‘배(盃)’는 그릇 명(皿)이 아래 있으니 토기나 사기로 만든 형상이다. 나무 술잔이든, 사기 술잔이든 모두 ‘아닐 불(不)’이 붙어 있는 이유 역시 “지나치면 아니 된다”는 뜻이 아니겠나.
‘한 잔’이든 ‘반 잔’이든 마시고 나면 ‘빈 잔’이 남는다.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이라고 가수 남진은 노래했다. 그런데 이 ‘빈 잔’은 취입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알려졌다고 한다. 그저 음반에 끼워 넣은 곡이어서 당시에는 홍보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30대에 불렀던 이름 없는 ‘빈 잔’은 70대가 되어 대표 레퍼토리가 된다. 통기타 세대일 때는 이장희의 “마시자, 한 잔의 술”을 목놓아 불렀지만, 인생으로 숙성되면서 ‘빈 잔’에 남은 추억을 되새기는 것인가.
그럼에도 ‘한 잔’과 ‘빈 잔’ 사이 ‘반 잔’이 아름답다. 반쯤 찬 술잔에 비친 그대의 얼굴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린다. 그대 얼굴이 고요하면, 비로소 입술과 술잔 사이에 넘나들던 ‘악마의 손’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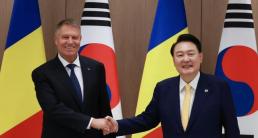




![[포토] 뉴진스 민지, 민희진 사태 이후 첫 공식석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82019421806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샤넬, 루쥬 알뤼르 팝업스토어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81937764040_388_136.jpg)
![[포토]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하는 일본 국회의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02617824927_388_136.jpg)
![[포토]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와 건강한 아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02824757554_388_136.jpg)





![[고사하는 식물기업] 1분기 기업파산 35% 폭증...탄광 속 카나리아 경고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50015633415_388_136.png)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