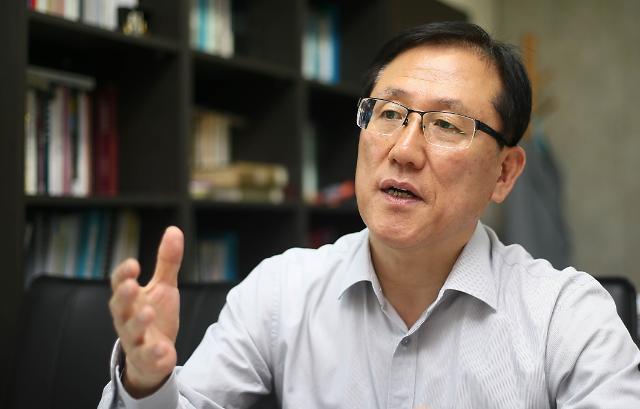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모래시계형' 한국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궁진웅 timeid@]
정부가 히든챔피언, 명문 장수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근 들어 중견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전적인 중견기업의 개념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한다.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이다.
중견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1500억을 초과하는 기업 또는 자산총계 5000억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해당되면 3년 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이 된다.
재단법인 중견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 5월에는 보다 원활한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생태계 조성과 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기치를 들고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아주경제와 원장 취임 후 첫 공식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중견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허리가 취약하다는 데 있다”면서 “모래시계형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와 엔저 등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 무역수지, 재정 적자 정도 등으로 봤을 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건이 괜찮다고 평가했다.
다만 1960~70년대 성장 패러다임이 국가가 지정한 주요 산업과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다보니 이후 기업들의 자생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공정한 경쟁, 창조와 혁신 등이 왕성한 시장을 만드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도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려는 관성에 젖어 있고, 성장과 고용을 저해하는 주요 규제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우선 공공부문 또는 대기업부터 취업하려 한다. 부모들도 그걸 원하지 않느냐”면서 “돈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기업가 정신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기업들이 앓고 있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해 “내가 기업의 대표라도 그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즉시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조세, 자금, 연구개발(R&D) 등 총 16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이자·보험료·보증료 등 금융부담과 각종 조세부담까지 더하면 약 10억원의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부 통계자료도 나왔다.
중견기업연구원은 출범 이후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김 원장이 개원 세미나에서 정부의 규모의존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다.
그는 “경제 정책에 있어 기본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가능한 지양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화·세력화됐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매출액, 종업원 수, 자산규모 등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지원을 차별하는 정책(size-dependent policy)은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약화시키고 스스로 가장 유리한 규모로 자신을 조정하도록 기업들의 성장생태계를 왜곡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외형기준 정책은 대개 정량화된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언뜻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이 외형 기준을 맞추려고 스스로 성장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대표적인 예가 각종 지표와 서류, 탈법을 통한 계열사 운영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중소기업 중 2007년까지 10년 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불과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소·중견기업은 28개사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을 단순히 외적인 기준으로 분류하지 말고 특정 예산을 배정, 기업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바람직한 대·중소, 중견기업 간의 상생방안에 대해 “동반성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나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슬라이드 포토] 성수동이 들썩! 입생로랑 뷰티 팝업 방문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84737983118_388_136.jpg)
![[포토]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 계획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4/20240424110945301676_388_136.jpg)
![[포토] 뉴진스 민지, 민희진 사태 이후 첫 공식석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82019421806_388_136.jpg)
![[슬라이드 포토] 샤넬, 루쥬 알뤼르 팝업스토어 포토콜 참석한 스타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23/20240423181937764040_388_136.jpg)






![[금투세 폐지 논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韓증시 불확실성 높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3/20240103150426112900_388_136.jpg)
